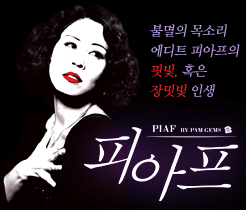최정원의 피아프
에디트 피아프는 누구인가?
에디트 피아프는 1912년 프랑스 파리 빈민가 베이르 72번가 길 위에서 에디트 지오바나 가숑이라는 이름으로 출생하였다. 창녀촌에서 유년기를 보내고 4년간 맹인으로 살다 극적으로 회복한 그녀는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다 프랑스의 술집 Gerny의 주인 루이스 르플레에게 노래를 인정받고 ‘에디트 피아프(작은 참새)’라는 이름과 함께 데뷔한다. 하지만 그가 피살되자 살인혐의를 받고 은퇴하였지만 시인 레이몽 아소, 여류작곡가 마르그리트 모노 등의 격려로 다시 일어선다(1935년).
사랑이야말로 그녀를 노래할 수 있게 만든 원동력이기에 사랑은 그녀의 삶과 노래에 유일한 주제였다. 그녀 주위에는 많은 남자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녀를 떠났고 그러면 그녀는 또 다른 사랑을 찾곤 했다. 1944년 물랑루즈 무대에서 이브몽탕을 만나 사랑에 빠져 결혼을 발표한 피아프는 그녀가 직접 가사를 쓴 장미빛 인생 (La vie en rose)을 발표한다. 하지만 그 역시 피아프를 떠났다. 그러던 그녀에게도 운명 같은 사랑이 찾아온다. 미들급 세계 챔피언인 권투선수 막셀 세르당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그와의 뜨겁고 진실했던 사랑은 그녀가 추구했던 행복한 삶의 원형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는 갑작스런 비행기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피아프는 떠난 그 사랑을 위해 사랑의 찬가 (Hymne a L’amour) 를 발표한다(1950).
사랑하는 연인의 죽음은 그녀의 삶을 더욱 비극으로 몰아갔다. 술과 계속되는 교통사고, 약물중독으로 최악의 몸 상태에서 그녀는 프랑스 파리 올림피아에서 마지막 콘서트를 진행한다(1962). 그리고 그 이듬해 그녀는 수많은 명곡을 남기고 23세의 젊은 남편이 지켜보는 가운데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았던 생을 마감한다(1963).
에디트 피아프의 음악
- La vie en rose (장미빛 인생) : 그녀의 제자였던 이브 몽탕과 사랑에 빠졌던 에디트 피아프가 사랑의 들뜬 감정을 노래했던 불후의 명곡. 이 곡은 불과 15분 만에 만들어졌다. 이 노래는 영화 <사브리나>에서 오드리 햅번이 불렀고, 루이 암스트롱이 리메이크 했고,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세계의 수많은 가수들이 불러왔다.
- Hymne a l'amour (사랑의 찬가) : 에디트 피아프의 단 하나뿐인 진실한 사랑이었던 세계 미들급 권투 챔피언인 막셀 세르당. 갑작스러운 비행기 사고로 그를 잃어버린 피아프가 짧은 사랑을 남기고 떠난 연인에 대한 슬픔을 그린 노래이다. 그가 죽고 2,3일을 자기 방에 꼭 박혀 있다 삭발하고 나타나 이 노래를 불렀다.
- Non, je ne regrette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아) :그녀가 마지막 열정을 다해 부른 곡으로 영화 <타인의 취향> <파니핑크> <몽상가들> 과 같은 세계적인 명작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되었다.
- 연극을 보고
‘최정원’ 이름 하나만 보고 주저 없이 선택한 연극, 피아프
처음엔 뮤지컬이라 생각하고 극장을 찾았는데 연극이었다.
뮤지컬 배우가 연극무대를 과연 소화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는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
우리 시대 최고의 뮤지컬 배우이자 흥행의 보증 수표답게
극장은 그의 팬들도 가득 찼고
그의 열정은 객석을 휘어잡고도 남았다.
사실 이 연극을 보기 전에는 피아프란 가수에 대해 들은 바도 없다.
허나 연극 속에 등장하는 귀에 익은 노래들,
그것이 프랑스의 상송 ‘장밋빛 인생’, ‘사랑의 찬가’, ‘아무 것도 후회하지 않아’라는
노래라는 걸 브로슈어를 보고 알았다.
프랑스의 전설적인 가수 피아프가 거리에서 구걸하며 노래하던
어린 시절부터 질퍽한 삶속의 피아프까지.
영화배우 이브 몽땅, 세계미들급 챔피언 막셀 세르담과의 정열적인 사랑,
마약에 빠져 서서히 무너져 가는 모습까지
최정원은 목소리와 걸음걸이와 꾸부정한 자세까지
치밀하게 계산된 연기를 보여줬다.
뻥뚫린 무대를 나무 한 그루와 벤치,
무대 위의 연주자 두 명
그리고 소품 몇 가지로 장소 이동을 통해 표현한 연출도 좋았다.
아쉬움이 있다면 단순함과 지루함을 없앨 수 있는 입체적 장면을 놓치고 있다는 점이다.
최정원은 역시 호소력과 흡인력이 강한 배우였다.
무대에는 그녀 밖에 보이지 않았다.
연극이 끝나고 극장 밖을 나와서
나도 모르게 그녀가 부른 '장밋빛 인생'을 흥얼거리고 있었다.